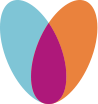‘복을 짓는 사람’
필자가 인터뷰를 진행한 작가님께 전한 표현이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각각에 일을 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작가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하셨다. “운이 좋았어요!” 시작한 계기가 운이 좋았고, 그 계기를 통해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한 분야에서 자리 잡기도 어려운데, 여러 분야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은 작가님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당연히 부러운 마음도 함께. 하지만 작가님 말씀처럼,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시작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결과는 작가님의 노력과 정성으로 만든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 복을 지은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화답을 한 것이다.
“굳이, 왜?”
이런 말을 들으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세상에, 남들의 어려움을 챙겨주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다. 남들을 위한 일이 수익이 되기도 하겠지만,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수입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다. 목적 자체가 돈을 벌 거나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한 사람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남 같지 않고, 그가 느끼는 아픔과 괴로움이 당신과 상관없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다.
코칭을 배우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보람이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필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 “남들 고민 들어주면 힘들지 않아? 내 고민도 많은데 남 고민까지 들어주려면 힘들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안 좋은 에너지를 퍼트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에너지에 휩싸이게 된다. 분위기에 휘말린다고 해야 할까? 내 기분과 별개의 분위기였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이럴 때 실감한다.
다른 사람 험담하고 뭐가 그리 불만인지 투덜대는 사람과 있으면 어떤가?
마음에 연탄재를 뿌리는 것처럼 지저분해진다. 환경도 그렇다. 어두침침하고 습한 곳에 있으면 어떤가? 스산하니 기분이 별로다. 반대로, 좋은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덩달아 좋은 에너지를 얻는다.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라도, 기분 좋게 인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가? 미소짓게 되고 어두웠던 마음에 작은 빛이 스며든다. 오전 내내 사무실에 있다가 점심 먹으러 밖으로 나갔을 때,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 기분까지 따뜻해진다. 이렇듯 환경의 에너지에 따라 내 에너지가 달라진다.
코칭은 그렇지 않다.
코칭을 하는 이유가 뭔가? 코칭은, 해결해야 할 문제에 관한 이야기다. 이 주제는 대체로 어두울 수밖에 없다. 가벼운 문제라면 아니겠지만, 중요한 문제라면 그렇다. 하지만 코칭 대화를 할 때는 고객의 어두운 에너지로 함께 어두워지지 않는다. 정말 신기한데, 과학적으로 증명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한두 번의 경험이라면 “오늘은 별일이네?”라며 그런가보다 넘어갔을 거다. 하지만 매번 그렇다면 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느꼈던 결정적인 순간의 기억을 공유할까 한다.
온종일 업무와 사람에 시달려, 진이 빠진 날이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 해도, 숟가락 들 힘조차 나지 않은 그런 날이었다. 그런데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코칭이 예정돼있었다. 코칭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아! 오늘 괜히 잡았나? 일이 생겼다고 하고 미룰까?’ 한참을 생각했다. 하지만 코칭 일정을 확인하는 그분의 메시지가, 그 생각을 접게 했다. 전문적인 코치도 아닌, 이제 배우는 사람을 코치라 불러주셨다. 코칭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졌다. 이런 분에게 더는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시간에 맞춰 전화를 드렸다.
메시지에서 느껴진 것처럼, 목소리에도 반가움과 기대감이 한껏 묻어났다. 그렇게 안부를 묻고 코칭을 시작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가끔 샛길로 새서 다른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 마치고 나니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내 상태가 어떻게 됐겠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초주검이 돼야 했다. 숟가락을 들기조차 힘들게 느껴질 만큼 진이 빠진 상태에서, 타인의 고민까지 들어야 했으니 말이다. 그랬을까?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필자조차도 신기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그렇게 맥을 못 추던 기운이 되살아났다. 어떤 일을 하든 시작 전보다, 마치고 났을 때 기운이 빠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빠졌던 기운이 다시 채워졌다. 충전이 됐다고 할까? 코칭을 하면서 떨어졌던 기운이 충전된 거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지 아리송했다. 중요한 건 이때뿐이 아니라는 거다. 코칭을 할 때마다 느꼈다는 걸, 이번에 다시금 알아차리게 되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기운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운이 생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누군가에게 기운을 주는 일인가? 기운을 빼앗는 일인가? 이는 어떤 일이냐는 분야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누군가에게 기운을 주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기운을 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기운을 주는 사람의 역할은 자신의 기운도 생기게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운이 채워지기에, 충분하다. 기운은 한정된 자원이 아니다. 나누고 쓸수록 채워지는 무한정한 자원이다. 하지만 안 쓰면 사라진다. 아낄 이유가 없다. 나눌 수 있는 기운이 있다면 마음껏 나눠도 되겠다. 코칭이 아니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