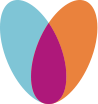필자가 교육받은 프로그램 중, <뉴 저널리스트 아카데미>가 있다.
‘뉴 저널리스트’라는 표현처럼, 새로운 저널리즘을 장착한 사람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일 저널링을 쓰고,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경험한다. ‘뉴 저널리스트’의 기본 원칙을 빌려 표현하자면, 뉴 저널리스트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진실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뉴스 생산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은, 매주 수요일 새벽 6시에 진행됐다. 3단계까지 총 26주 동안 진행되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저널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더 깊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 좋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소개해볼까 한다.
‘지정의(知情意) 학습’이다
‘지(知)’는 깨달음이다. 알지 못했거나 어렴풋이 알았던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을 지(知)라고 할 수 있다.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 정(情)으로 연결된다. 정(情)은 알아차린 것을 감정으로 느끼는 거다. 믿음에 대한 확신[지(知)]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정(情)]을 품게 된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계획을 세우고 이뤘을 때를 상상하기도 한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앞으로의 희망이 있으니, 버킷리스트도 작성할 수 있는 거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깨닫고 느끼게 되면 다음은 어디로 연결될까? 의(意)로 연결된다. 깨닫고 느낀 사람은 가만히 있기 어렵다. 실천해야 한다. 어떻게 이룰지 차근차근 방법을 찾으면서, 조금씩 걸음을 뗀다. 해야 할 리스트에 ‘X’ 표를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다.
‘지정의 학습’은 항상 강조됐다.
단계가 올라가면서, 그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졌다. 1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이었다면, 2단계는 보다 확장되고 구체적이라고 해야 할까? ‘활동’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졌다. 그러면 ‘체헐리즘’의 대표적인 기자라고 하면서, 한 분을 소개했다. 참고로 ‘체헐리즘’은, ‘체험’과 ‘저널리즘’의 합성어다. 직접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라는 말이다. ‘어떤 체험을 했다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올라올 때쯤, 영상을 보여줬다.
방송으로 방영된 영상이었다.
기자로, 기사를 쓰는 방식이 남달랐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내용을 이해한 것만으로 쓰지 않았다.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영상을 보는 내내, 용기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고 쓰는 게 아니라, 1인칭 시점으로 체험한 기사는 어떠하겠는가? 교수님은 이분이 진정한 ‘뉴 저널리스트’의 표본이라고 말씀하셨다. ‘뉴 저널리스트’라는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정립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정의’의 완성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정립했다. 온전히 받아들였다고 할까?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은 실천으로 증명된다.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히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 ‘지’와 ‘정’의 마침표는 ‘의’다. ‘의’는, ‘지’와 ‘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휘되기 어려울뿐더러, 설사 발휘되더라도 지속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느낀 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와 ‘정’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실천하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의지로 돌렸기 때문에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 싶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는데 더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는가? 하지만 정말 문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코칭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코칭의 정의가 뭐라고 했던가? 고객의 떨어져 있는 에너지를 끌어올려 스스로 답을 찾게 해주는 것이라 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왜, 에너지가 떨어졌을까?’ 그걸 알면, 떨어지게 두지 않았겠지?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거나, 왜 해결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다. ‘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정’도 작동하지 않는다. 깨닫고 느끼지 못했는데, 움직인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악순환이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떨어진 에너지로는 의지가 발휘되기 어렵다.
코칭을 하면 사람들이 “아!”라는 작은 탄식과 함께,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 순간을 맞이한다. 이때가 바로 ‘의’를 실천하기 위한 ‘지’와 ‘정’이 완성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왜’를 알고 ‘무엇’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연스레 알게 된다. 묻지 않아도 본인이 이야기한다. 그럼 남은 건 뭐다? 그렇다. 실행이다. 이런 생각까지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가? 몇 톤은 올라간다. 믿지 못하겠다면, 코칭 과정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된다. 처음 시작할 때의 목소리 톤과 마칠 때쯤의 목소리 톤의 차이를 말이다. 아! 녹음 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 필수다. 이 말은 즉, 에너지가 올라갔다는 의미다. 고객의 에너지가 올라가면 코치의 에너지는? 당연히 함께 올라간다. 이때가, 코칭의 매력을 절절하게 느끼는 순간이다.